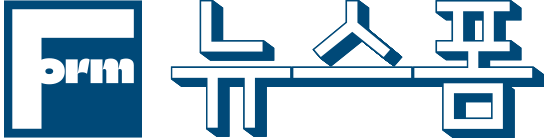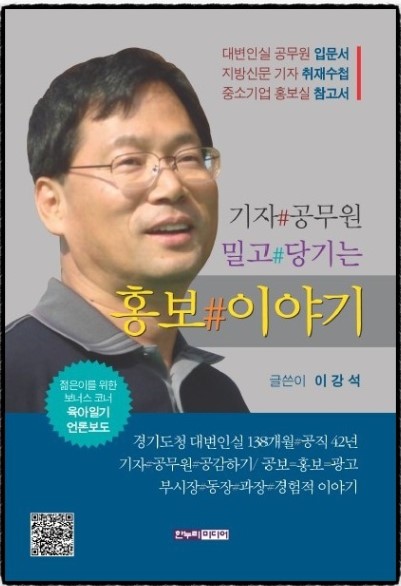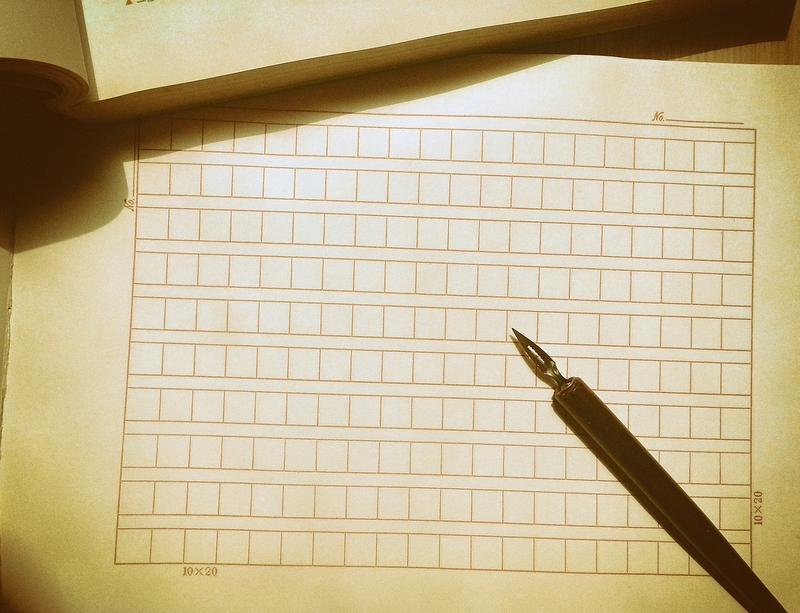
1988년 겨울 이야기입니다. 중앙사 K기자는 100자 원고지에 살살 내려쓴 후 팩스 보내고 데스크에 전화하면 끝입니다. 그날 송고해야 할 기사를 난로가에서, 소파에서 머리속으로만 구상한 후 이제다 싶으면 자리에 앉아 플러스 펜으로 초서처럼 내려쓴 후 다시 읽어보지도 않고 팩스에 밀어 넣습니다.
잠시후 본사 지방부에 전화를 해서 도착여부만 확인하면 끝입니다. 생각 2시간 기사작성 3분, 송고 2분이면 기사는 마무리됩니다.
다른 중앙사 L기자는 원고지 200자에 오전시간을 다 쓰십니다. 아침 10시에 보도자료를 배포하면 앞으로 자신에게는 8시반에 미리 달라는 주문을 하면서 기사작성에 들어갑니다. 우선 제공된 보도자료에 검정색으로 수정 가필한 후 읽어봅니다.
다시 100자 원고지에 옮겨적고 붉은색으로 가필한 후 청색으로 고치고 검정색으로 추가합니다. 원고지 위에 교통지도, 도로망도가 그려진듯 복잡하고 글씨도 둥글둥글합니다.
그래서 늘 바쁘신 L기자님은 점심시간 맞추기도 어렵습니다. 당시에는 잘나가는 석간신문이었으므로 오후 1시경 지방판이 마감됩니다. 점심을 제때에 맞추지 못하고 늘 허덕허덕 입니다. 수차례 수정과 가필을 거듭한 끝에 또다시 정서한 원고에 수정을 한 후 팩스기로 뛰어 가십니다.
송고하러 가면 늘 팩스기는 만원입니다. 소리소리 고래고래가 따로 없습니다. 전쟁이라도 터진듯한 분위기입니다. '왜 바쁜 판에 팩스를 쓰느냐' 고함을 치십니다.
기존에 보내던 자료를 빼내고 자신의 원고를 서울 본사로 보냅니다. 왜 이리도 팩스기는 느린 것인가요. 나오는 원고를 잡아 뽑습니다. 그리고 본사에 전화를 합니다. 본사 담당자와 통화 중인데 마지막 페이지는 아직도 송고 중입니다.
데스크에서 그래도 잘 받아 주나 봅니다. 평소 소주한잔은 하시는 사이일 것입니다. 보내놓고 또 전화를 통해 기사를 수정하고 고치십니다.
오후 석간 지방판에 2단기사가 나옵니다. 제목은 2단이지만 기사내용은 4단 분량이니 지면의 이 골목 저 골목을 누비고 다니며 기사를 읽어야 합니다.
고인이 된 L기자는 선배님으로 부르고 싶습니다. 아니 그냥 '선배'라고 불러야 극존칭이라 했으니 '선배'라 부르고자 합니다. 고인이 된 그 선배가 그립습니다.
기관 간부들과 언론인들이 만찬을 하던 중 언쟁이 벌어지자 선배는 후배 기자들을 질책하며 '너희들을 야단치느니 내가 벽을 차버리겠다'고 액션을 하다 발가락이 골절됐습니다. 당시 50대 초반이었습니다.
뼈가 아무는데 달 반 이상 걸렸습니다. 사무실 차로 출퇴근 시켜드린 기억이 납니다. 2년 전엔가 상가에서 만난 B기자가 당시 현장에 함께 하였고 사건을 생생히 기억한다며 반가워했습니다.
언론인들의 기사작성 방식은 언론사 수 이상으로 다양합니다. 기사작성에 전심전력하여 점심을 거르는 경우를 많이 보았습니다. 간단하게 다른 기자의 기사를 참고하여 숫가락 올리고 가는 방법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두 분은 달랐습니다.
그래서 고인이 된 두 분 선배가 그립습니다. 기사작성에 5분이면 족한 K선배가 그립고 2단 기사에 5시간이 필요한 L선배가 보고 싶습니다.
 [저자 약력]
[저자 약력]
-1958년 화성 비봉 출생
-경기도청 홍보팀장, 공보과장
-동두천·오산·남양주시 부시장
-경기테크노파크 원장
-경기도민회장학회 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