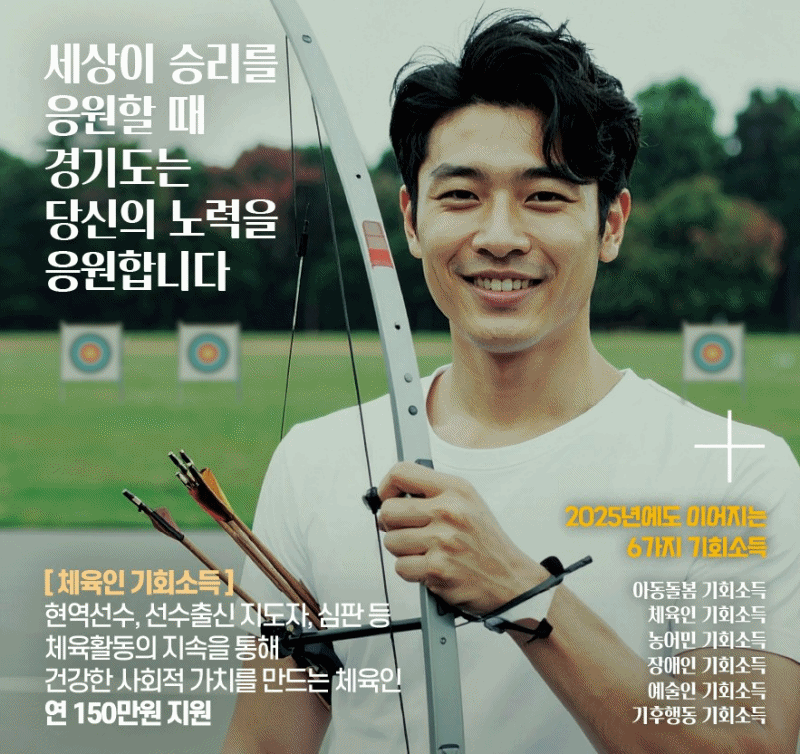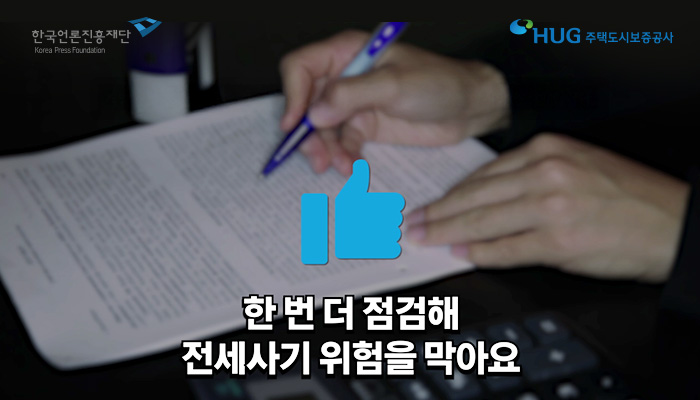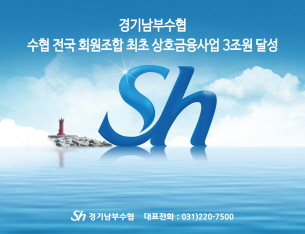색깔 영롱한 이름도 없는 새
날갯짓 거두고 은사시나무위에 함초롬 앉아 있다
뒤돌아보니 밤새 날아 온 흔적은
안개 속으로 사라져 버렸다
한 숨을 돌리는 사이
바람은 나뭇가지를 흔들고
나뭇가지는 고요히 앉아 있는 새를 흔들고 있다
숲속은 어느새 소란해지고
새는 더 이상 머물 수가 없었다
삶은 비와 바람과 햇볕과 달빛
그리고 별빛과 몸 비비며 사는 것이라지만
스산했던 숲은 모르는 사이 잡초 우거진 늪이 되었다
아무런 생각 없이 홀로 있고 싶은 새
오늘도 이 골짜기에는
풍향을 알 수 없는 바람이 불어 왔다
기도를 위해 두 손 다소곳이
포개는 새 한 마리
눈부시다.

김재자 시인
경기화성 출생, 시집 『말 못하는 새』가 있으며 문예지 및 일간지에 작품발표,
글샘동인, 현재 용인병원유지재단 이사
시평(詩評)
새는 우리 인간과 가장 가까이에서 함께하는 날개동물이다. 그렇기 때문에 작가들은 인간을 새에 비유하는 경우가 많다. 시인은 이러한 시적 비유법을 응용하여 본인이 겪었던 일상적 일화를 우회적으로 시로 승화시켰을지도 모른다. 오직 일에 열중한 새 한 마리는 평생을 앞만 보며 수만리를 날아 왔다. 그런데 어느 날 보니 날아왔던 흔적, 즉 공적(功績)이 모두 사라진 것이다. 참으로 허무한 것이다. 세상 속에서의 삶은 비와 바람과 햇볕과 달빛 그리고 별빛과 몸 비비며 사는 것이라지만 그 안에는 원칙과 정도가 있는 것이다. 만약 그러한 환경이 조성되지 않는다면 나무가 울창한 숲은 서서히 황폐화 되는 것이다. 시인은 풍향을 알 수 없는 바람이 부는 숲, 즉 어지러운 세상이 늘 아름다운 숲이 되기를 기도하는 것이다. 그래서 눈이 부신 것이다.
정겸(시인/한국경기시인협회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