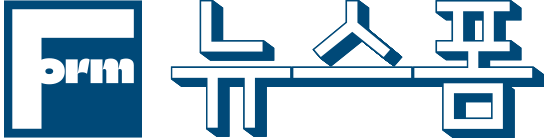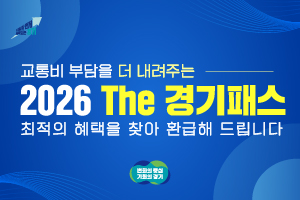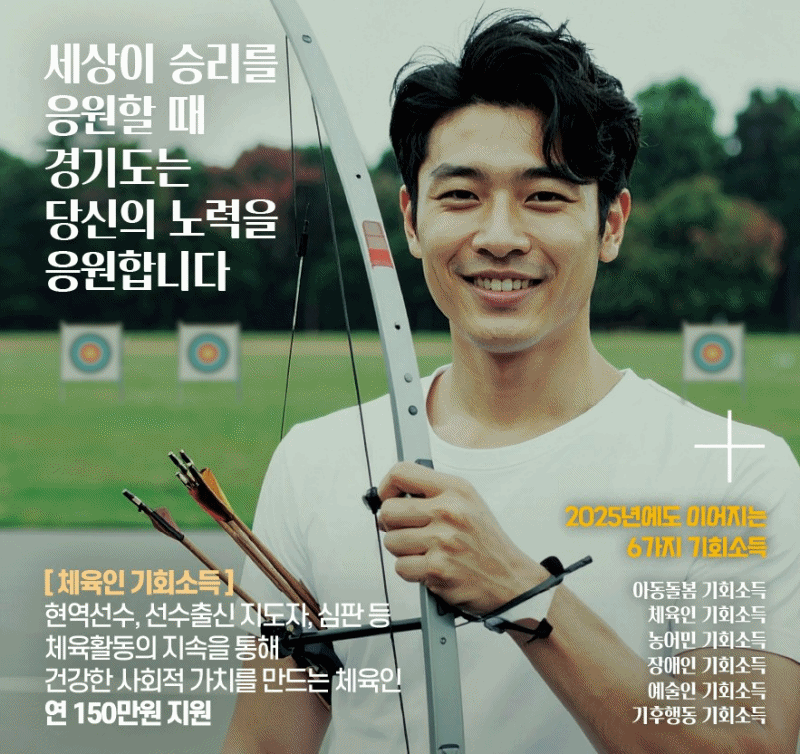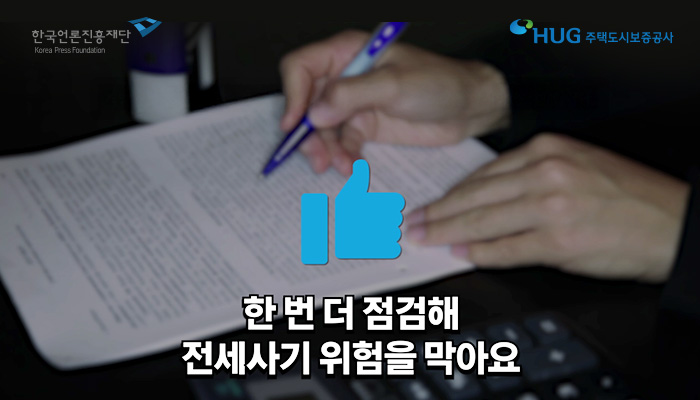외눈박이 청솔모가 잣 한 송이 물고
전깃줄 위를 아슬아슬 건너간다
중간정도 갔을 때
소나기 한줄기 퍼붓는다
잣송이를 놓일세라 이 악물고 기어간다

삼분의 이 정도를 지났을까
또 한 번 몰아치는 거센 바람
잠시 주춤거리며
머리 숙여 바람 피하고 있다
순간, 한줄기 회오리바람에
툭, 잣송이 계곡으로 떨어졌다
전깃줄에 대롱대롱 매달린 청솔모
그네처럼 흔들거린다
떨어진 잣송이 뚫어지게 바라보더니
온 힘을 다해 계곡으로 몸을 날린다
잣송이를 입에 문 청설모
입가에 선혈이 낭자하다
피 묻은 잣송이를 사이에 두고
새끼 청솔모들 정신없이 잣 알 빼먹고 있다
외눈박이 청솔모
자식들의 먹는 모습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지그시 눈을 감는다
깡마른 등줄기 따라 땅거미 몰려오고 있다.
-시작메모-
우리가 어릴 때 아버지의 존재는 어떠했는가? 비바람 몰아치고 천둥번개가 번쩍 거리며 굉음을 내도 아버지만 곁에 있으면 하나도 무섭지 않았다. 그런 아버지도 밖에 나가 돈을 벌고 자식들의 먹잇감을 위해 일 할 때는 상사의 눈치를 보며 비굴해지기도 하고 건설 공사현장에서는 목숨을 바쳐 먹잇감 사냥을 한다. 직장 상사가 뭐라 해도 실직 될까 두려워 자존심 죽여 가며 오직 처자식 생각으로 허리 구부려 굽실거린다. 먹잇감이 있을 때는 어느 누구에게 양보 없이 사투를 걸며 쟁취 한다. 잣 한 송이 얻으려고 전깃줄 위에서 폭풍우와 싸우는 청솔모의 부정(父情). 피투성이가 된 잣 한 송이, 왜 피가 묻어 있는 줄도 모르고 형제들은 그것을 물고 뜯었다. 자식들을 위해 오로지 일만 해오던 아버지. 처자식 먹여 살리려고 허기진 배 움켜잡고 낡은 지게 지고 좁은 논두렁을 밟으신 아버지, 지금은 이 세상에서 볼 수 없는 아버지, 그때는 왜 몰랐을까. 오늘 따라 더욱 그립다.
(시인/한국경기시인협회이사 정겸)
정겸 시인 
출생 : 1957년 경기 화성(본명 정승렬)
경력 : 경기도청 근무
등단 : 2003년 '시를 사랑하는 사람들'
시집 : 푸른경전, 공무원, 궁평항
수상 : 2004년 공무원문예대전 시부문 행정자치부장관상
2009년 공무원문예대전 시조부문 행정자치부장관상, 경기시인상 수상
현재 : 칼럼니스트와 한국경기시인협회 이사로 활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