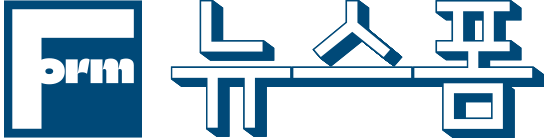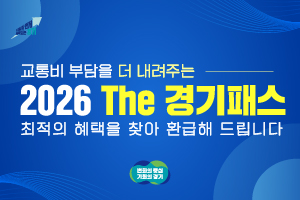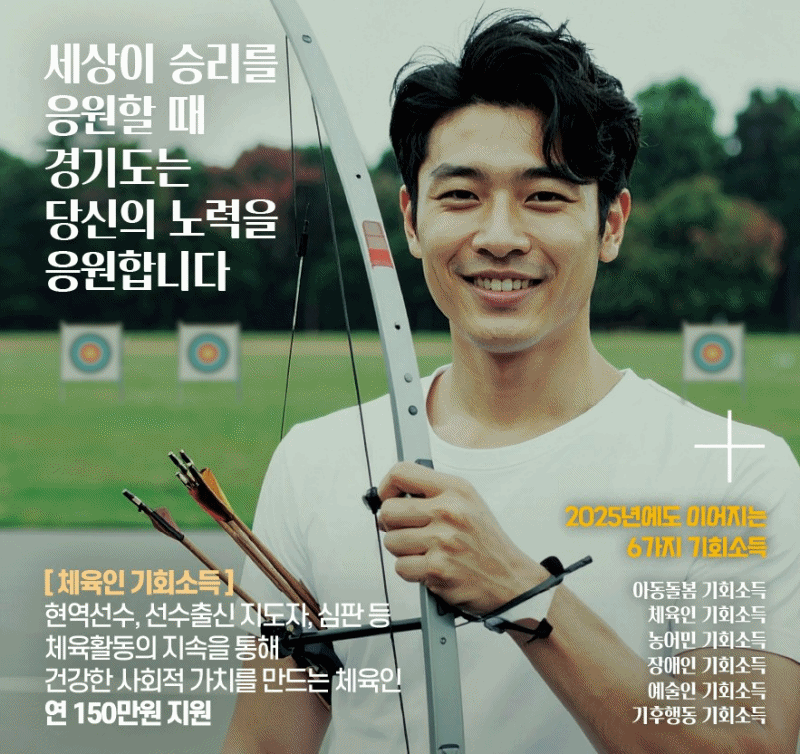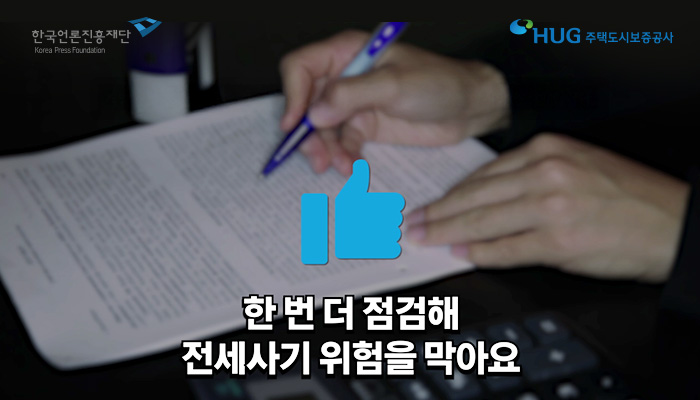푸른 기운 하나 없는
잎 떨어진 버드나무에 동그마니 앉아 있는 새
칼바람을 악기 삼아 노래 부른다
추억의 소야곡인지 희망의 속삭임인지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아련하게 사라져 간 청보리 밭에서
내가 불렀던 그리운 노래였다
바람 부는 날은 새가 울었고
흰 눈 내리는 날에는 새가 웃었다
새는 항상 나의 주변을 맴돌고 있었다
내가 새를 좋아하는 것도 새가 나를 좋아하는 것도
항상 서로가 눈빛을 함께 나누었기 때문이다
가시덤불 우거진 산길을 나 홀로 걸어 갈 때
새 한 마리 날아와 낮에는 햇빛 한 줌을
밤에는 별빛 한 줌을 선물로 주었다
여윈 하현달빛 아래로
은빛 억새풀이 바람에 흔들린다
어디선가 겨울 나그네의 노래가 들려오는 지금
작은 한 숨이 사방으로 흩어진다.

김재자 시인
경기화성 출생, 시집 『말 못하는 새』가 있으며 문예지 및 일간지에 작품 발표,
글샘동인, 현재 용인병원유지재단 이사
-시작메모-
우리의 삶의 언저리에는 항상 새라는 날짐승이 등장한다. 이솝우화, 전래동화, 혹은 시와 소설 속에도 새는 주인공이거나 아니면 길동무정도로 소개되는 경우가 많다. 새는 그만큼 우리주위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동물이기 때문이다. 이 시에서도 시인은 새를 소재로 이야기를 끌고 나간다. 버드나무에 앉아 있는 새, 그리고 칼바람을 하나의 노래로 회화시키며 과거가 되어 버린 추억을 소환해 낸다. 꿈도 많았던 젊은 시절, 당시는 추억의 소야곡보다는 희망의 속삭임이 더 좋았을 것이다. 그러나 살아오는 동안 해와 달이 뜨고 지고 세월은 많이 흘렀다. 시인은 ‘가시덤불’ 이라는 시어를 상징화하며 고단했던 그의 삶을 시속에 그려 넣었다. 이제 희망은 사치이며 햇빛 한줌과 별빛 한줌도 시인에게는 고마운 선물인 것이다. 여윈 하현달빛은 어쩌면 고달프고 힘들었던 길고 긴 여정을 의미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지금은 조용한 노래를 들으며 은빛 억새풀 같이 여유롭고 쉼이 있는 삶을 살고 싶은 것이다.
정겸(시인/한국경기시인협회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