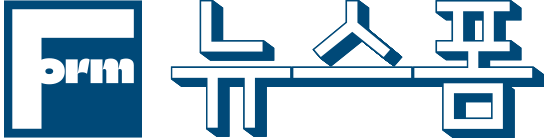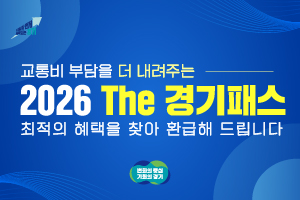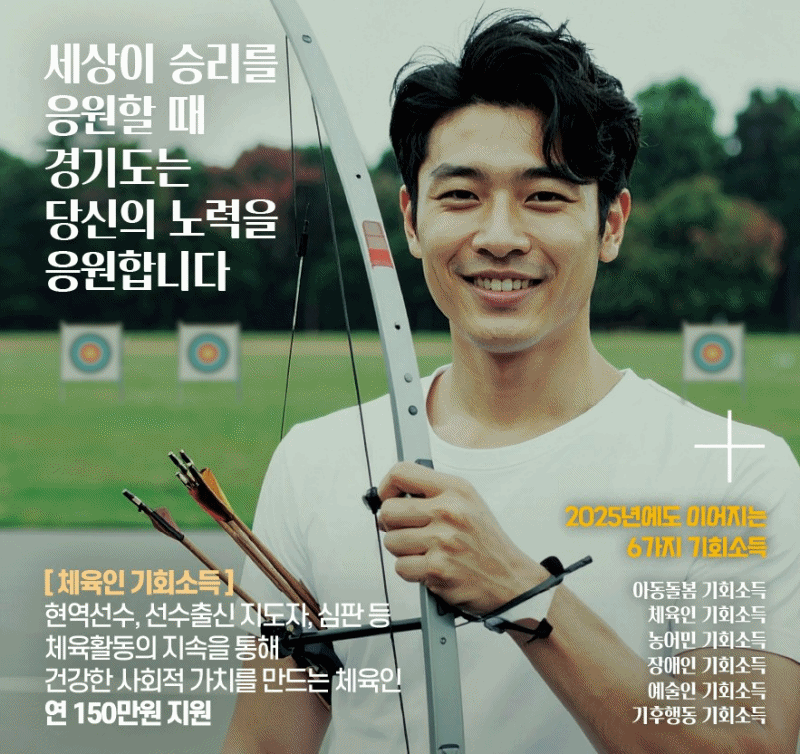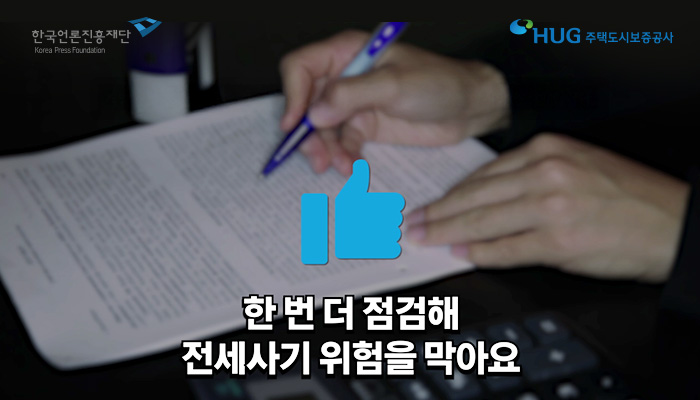고향집 근처 실개천
암맷돌 숫맷돌 징검다리 놓여 있다
맷손은 사라지고 암쇠와 수쇠도 보이질 않는다
깊이 패인 홈은 모두 마모되어 민낯이다
한 평생 마주 앉은 두 사람 들숨 날숨 맞춰가며
서로 보듬고 의지 하며 볼 비비는 회전 마찰음
휑하니 뚫려 있는 구멍 속으로 몇 가마니 쌀과 보리쌀
몇 말의 콩이 산화되어 나의 빈속을 채워주었을까
자식들 손발에 물 묻히지 말라고
가시고기가 되어 버린 저 맷돌
흐르는 물속에 반쯤 묻힌 채 야윈 등 내밀며
어서 밟고 건너가라 하네.

정겸 시인
1957년 경기 화성출생(본명 정승렬), 2003년 시사사 등단, 시집 '푸른경전', '공무원', '궁평항', 공무원문예대전 시, 시조부문 행정안전부장관상, 경기시인상 수상, 현재 칼럼니스트와 한국경기시인협회이사로 활동
-시작메모-
맷돌이 우리 주위에서 점차 사라져 가고 있다. 맷돌은 두 개의 넓적한 원형의 돌을 위 아래로 포개 놓은 형태로 되었으며, 마찰부분은 위아래 엽전모양의 쇠를 끼워 마모 방지와 회전을 원활하게 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 또한 윗돌 가장자리에 맷손이라는 손잡이를 만들고 가운데에 구멍을 뚫어 그 구멍 속으로 곡식을 서서히 넣으면서 맷손을 돌리면 곡식이 갈려나오는 오늘날의 분쇄기다.
맷돌의 일생을 살펴보면 어쩌면 늘 자식들을 위해 희생하신 부모와 같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고향이라는 낙원과 부모님에 대한 그리움을 가슴 한편에 고이 간직하고 있다. 부모님들은 자식들을 위해 아가페적 사랑을 베풀었다. 맷돌처럼 제 몸이 다 닳아 없어지면서도 오직 자식 생각이다.
삶에 지쳐 돌같이 무겁고 힘든 몸을 수 만 번 돌렸다. 손금과 지문이 다 닳아 없어질 정도로 일만 했다. 자식들에게는 힘든 내색 없이 거친 곡식들을 곱게 갈아 일용할 양식을 제공했다. 오늘 내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도 모두가 부모의 은덕이다. 가시고기가 되어 버린 우리 엄마와 아버지. 마지막 까지 자식들이 시냇물 건널 때 빠지지 말고 건너라며 징검다리가 되었다.
정겸(한국경기시인협회 이사)